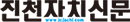중제 마르지 않는 우물 만큼이나 사람사는 정이 넘쳐나는곳

덕산 시가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몽촌마을로 이르는 호젓한 꽃길을 만나게 된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지명석에는 '꿈마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누군가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는 버선발로 맞아줄 법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
꿈의 계시로 찾은 명당
이 마을은 유서 깊은 곳이다. 이괄의 난을 피해 공주까지 피신했던 인조를 수행했던 순당 채진형이 전의에서 인조를 이별하고 처가가 있던 이곳으로 와 꿈속에서 본 땅을 찾아 정착한 곳이 바로 몽촌마을이라 한다. 꿈말, 구말, 몽촌, 용몽리라는 지명이 이 꿈과 무관하지 않다.
순당은 당시 수혜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방죽을 설치하고 마을 입구에는 은행나무를 심어 마을의 안녕과 자손의 번창을 빌었다. 지금은 방죽이 메워지고 나무가 심어졌지만 아직 마을에는 수령이 340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군보호수로 지정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방죽이 일부 남아 있어 여름이면 연꽃이 장관을 이룬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을
몽촌마을은 30여 호에 인구가 120여명인 작은 마을이지만 다른 지역의 농촌마을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다른 마을을 생각한다면 초등학생이 14명이나 되는 이 마을은 바람직한 연령 구성비를 보여준다. 이는 농촌마을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물론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전업농은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수박이나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의 과수 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구마 풍년 인심도 풍년
방죽 옆에 세워진 정자에 다다르니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마을과 이장님 자랑에 침이 마르신다.
“올해는 모다 풍년이네. 자, 이리 올라와서 고구마 좀 들어요.”
처음 보는 외지인에게도 스스럼없이 고구마와 식혜를 건네는 인심이 마을에 드는 햇살만큼이나 풍성하다.
쭦 임금님도 감동한 효심
12대째 이 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채건병(76세, 노인회장) 할아버지는 집안의 내력이 바로 마을의 역사다. 예전에는 이곳이 평강 채씨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마을 자랑을 부탁드렸더니 마을 터와 오면서 보았던 효자문 이야기를 꺼내신다. 현몽을 얻어 자리 잡은 터는 수해가 없고, 마을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농사까지 지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우물물은 마을의 유사 이래로 말라 본 적이 없다 한다. 또한 사람들의 심성이 선하고 고와 병든 노모를 위해 손가락을 잘랐던 부자의 이야기에 감명 받은 임금님이 효자문을 하사하셨다 한다. 더불어 채재병 이장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장님은 몽촌의자랑
올해로 5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는 채재병씨는 재임 기간 중 농로 확장공사와 우물의 증·개축, 방죽정비와 산책로 조성,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팔각정 신축 등 마을의 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다. 현재는 마을 진입로에 공간을 확보해 출향민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꽃길 가꾸기와 관상수 식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무를 기증하고 있으나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또한 효자문이 있는 마을답게 노인복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틈만 나면 마을을 돌며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잡다한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은 자비를 털어 제철에 맞는 보양음식을 대접하고 무료하지 않도록 작은 행사들을 자주 연다고 한다.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마을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이장님을 꼽는 이유를 알겠다.
편안한 이웃집 같은 몽촌
마을 주민들은 몽촌마을이 누구나 찾아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 봄이면 여기저기 과실수들이 피워내는 꽃들이 융단처럼 깔리고, 여름이면 연꽃 향기 가득한 정자에서 시원한 우물물을 들이키고, 가을이면 웅장한 은행나무 잎이 동네어귀를 노랗게 뒤덮어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게 하고, 겨울이 되면 그 새하얀 눈만큼이나 포근한 인심이 피어나는 몽촌마을. 주말엔 무겁고 답답한 발걸음을 그 곳으로 옮겨보자. 돌아오는 발걸음이 마을 할머니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만큼이나 경쾌해질 것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진천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