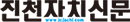최근 최진실씨의 자살과 관련하여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댓글의 저질성이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최진실씨는 오래전부터 악플러들의 인격 모독성 인터넷 댓글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었다고 한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고인의 고통이 삶을 유지하기에 위태로운 수준임을 우리는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자살을 막지 못한 책임은 가족들의 미숙한 대응을 탓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두의 책임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최진실 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케 한 우리의 미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질타하기에 앞서 소위 사회복지사의 한사람으로서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스스로 명문대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어느 좌표에 멈추어 있는지 자문해 본다. 그리고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사의 숙명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나는 이미 기성세대이며, 어느 정도 이 사회의 단물을 맛 본 속물은 아닌지 나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 본다.
나는 지금까지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그리고 세계에서 부러워할만큼 선도적으로 우수한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느껴졌었다. 인터넷 상에서 과거의 동창들을 만날 수 있어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한 지식과 섣부른 호기심을 채울 수 있어 기뻤으며, 오락게임을 통해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어 고마웠다.
그래서 더 빨리 이 문명의 이기(利己)를 만났었더라면 내 인생이 더 빨리 더 많이 즐겁고 풍족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아쉽기 조차 했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언어를 접하며 새롭게 창조되어 만들어지는 언어의 창조성과 그 전파력에 감당하지 못할 버거움을 느끼면서도 만든이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까지도 해왔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광장(廣場)으로서의 인터넷의 위상에 탄복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인터넷 문화는 어떠한가? 자신을 감추고도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할 수 있으며, 몹쓸 언어적 유희에 쉽게 농락당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인터넷이지 않은가? 최진실씨의 자살소식을 접한 지금까지도 설마 그 원인을 제공한 '악플러'들이 소위 소수의 사회적 불만세력이거나 반사회적 성향의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흘리고 전파시킨 그들은 아마도 보통사람들일 것이다. 평범한 학생,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주부 등 아마 모두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일 것이다. 그들은 왜 소위 '악플러'가 되었을까?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들을 소도둑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거리의 청소년들의 흡연장면을 보면서 야단치지 못하는 사회, 불량한 태도에 고개를 돌리는 사회, 잘못된 것이 있어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회. 바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저질의 인터넷 댓글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찬반 의견들이 있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모양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들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기는 하는 것인가?
교육은 학교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내에서, 학교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삶의 다양한 현장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터넷상에서도 교육적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모토에서 출발한지 벌써 30년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지도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개인의 복지구현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복지관련 실천 현장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하여도 무책임한 인터넷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개인의 복지는 완성되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을 위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이 영역은 사회복지실천영역의 변방일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다. 어느 선배 사회복지사 누구도 아직까지 주장해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사회복지사다. 고통받는 이 옆에 그래도 우리는 같이 있어주어야 할 것 같은 숙명적 책임감을 갖는 우리들이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소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저력을 발휘해 보자. 그래서 악성 바이러스성 인터넷 언어를 사라지게 해 보자.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정립해 보자. 바로 지금이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주도적 세력으로서의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볼 때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복지를 구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진천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