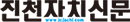70 평생 서로 이해하고 믿으며 살아온 삶 '아름다워'
백곡 배티마을서 이웃의 정 나누며 행복한 삶 영위
백곡면 배티고개 아래 아담한 흙집에 서로를 꼭 닮은 김복예(88)·정일성(91) 노부부가 살고 있다. 부부의 연으로 맺어져 70평생을 한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들. 소복이 내려앉은 흰머리와 눈과 얼굴에 번진 주름엔 그들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지만 18살 소녀와 21살 청년이 처음 만났던 70년 전 그날,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은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남은 세월도 지금처럼 함께 살면서 마무리 잘 지읍시다”라며서로의 손을 살포시 어루만지는 두 분의 모습을 한동안 멈춰서 바라봤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을까. 가늠조차 안 될 만큼의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그들의 삶이 알고 싶어졌다.
전쟁이 갈라놓은 부부의 7년
소녀와 청년은 70년 전 동네 사람의 소개로 만나 부부가 됐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년은 전쟁터로 내몰렸다. 최전방 통신병으로 군인 생활을 하며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고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둘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7년 만에 만난 남편이 나를 향해 걸어 들어오는데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다”며 당시를 회상하는 그녀의 눈에서 남편을 향한 애틋함이 짙게 묻어났다.
그들은 백곡면 성대리 모니마을에 둘 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시작한 결혼생활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다. 한 순간 이별해 소식조차 알 수 없던 시간을 겪어 봤기에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삶
그들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밀가루 죽으로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어려운 형편에아이들은 그들이 꿋꿋하게 삶을 살아야 했던 유일한 이유였다.
그들은 밤낮없이 일했다. 여름엔 화전을 개발해 잡곡, 수수, 콩, 팥 등을 일궜고 겨울이면 산에서 망개 뿌리와 억새를 캐 수세미를 만들었다.
젊은 날 그는 작물과 수세미가 담긴 등짐을 짊어진 채 수 없이 안성 장을 향해 배티고개를 넘나들었다.
그들은 “그때 당시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했지만 아이들 커가는 재미에 고생인줄도 모르고 그저 재밌게 살았다”며 웃음 지었다.
어려운 살림에 자녀 셋 모두를 공평하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지만 그들은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게 평생 가슴에 한으로 맺혀 미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아들이 10년 전 충북보건대학교를 졸업했고 부모의 평생소원을 들어주려 애쓴 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배티마을에서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명성이 자자하다.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산에 큰 물통을 짊어지고 올라가 채취해 온 고로쇠 물을 이웃들과 나눠 마셨다. 봄에는 나물을, 가을에는 도토리와 밤을 캐 나누기도 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못 하고 있지만 나눌 수 있다면 콩 한쪽이라도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게 그들이 삶을 살아온 방식이다. 예쁜 마음마저 똑 닮은 부부.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인지 그들의 말투와 얼굴엔 너그러움이 넘쳐난다.
그들은 서로를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 불렀다. 70년이란 세월동안 삶을 함께 해온 그들은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간의 이해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품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했다.
백년해로(百年偕老). 이 부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이들의 남은 삶이 지금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며, 자녀 정춘영(63)· 정필영(59)·정춘자(56) 씨의 삶도 필시 그들과 꼭 닮아있으리라 생각했다.